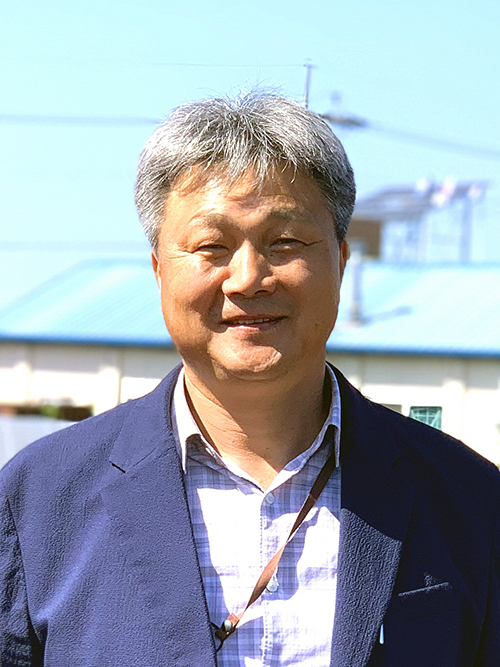
군서면 모정리
영암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요즘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글쎄요” “뭐 행복한 편이죠” “별로 행복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주관적 기준을 척도로 답한다.
행복이란, 편안한 심리상태(Good mental states)를 의미한다. 내 삶은 괜찮다거나 편안한 마음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행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첫째.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둘째. 감정 상태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Good mental states)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라고 본다. ‘행복지수’는 개인의 행복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 국민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가를 살피는 것이다. 행복지수를 중요하게 보는 목적은 정부를 물론 사회 전체가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는 결국 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 국내 정치인과 관료들이 일본 핵 오염수 방출을 옹호하는 꼴불견, 소금값 폭등으로 구매하기 힘든 일상도 참 불편한 환경이다.
객관적인 측정으로 행복지수를 비교한다
유엔이 지난 3월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라는 보고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영역의 환경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 및 복지(social support :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소득. 경제력(income : 1인당 국내총생산) △건강. 장수(health : 기대수명,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가) △자율권(freedom :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언론, 사상의 자유도 포함) △사회적 관용, 배려(generosity : 사회적 약자를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의 관대한 수준) △공정사회, 부정부패 여부(absence of corruption : 사회의 부정부패 정도, 정부와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정도 평가)
2023년 행복도 1위는 핀란드(7.804점)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권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임을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는 ‘중진국’ 이하 수준에 그친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최고, 불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은 행복지수로 그대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국민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국민행복지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희망, 자부심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지표이다. 우리가 경제성장에 목매고 열심히 일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격차 심화’라는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국민총생산의 증가가 결코 국민의 복지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풍족해졌지만 삶의 만족도인 행복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 행복조사(2022년)를 보면 최근 3년간 행복감이 감소 추세이며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영암군민의 행복지수도 낮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0위이다. 국민행복지수(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과 삶의 만족도를 종합한 지수)는 E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 필요
한국사회의 공동체 문화 속에 ‘정(情)’이라는 감성이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흉허물도 감싸주는 소중한 감성이 쌓여 정(情)이 되었다. 정(情)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개인에게 소속감을 주어 심리적 안정을 준다. 지역사회 안전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세계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우리 공동체 문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문화이다. 2016년 그 많은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촛불 혁명으로 성공시킨 원동력은 다름 아닌 공동체 연대감이었다.
이제는 물질적 풍요만 쫓기보다는 정이 넘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체육·문화·예술·여행·봉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성화되어 정을 나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소확행(소소한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