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자 시종면 월악보건진료소장
시골 진료소에서 젊은 시절 보내고
올해 정년 맞아 새로운 삶 꾸릴 계획
“제 삶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흙 묻은 거친 손을 소중하고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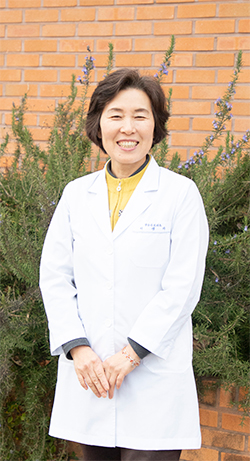
시종면 월악보건진료소 서경자(60·강진 출생) 소장은 자신이 근무해왔던 시골 진료서에서의 36년 동안의 삶을 몇 마디로 정리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곧바로 1983년 보성군 회천면 회룡리에 간호 인력으로 위촉됐다. 지금은 일반직화 됐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직렬이 없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1987년 별정직 공무원화되면서 자신의 직무에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한다. 취업 당시엔 간호과 학생들에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가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니 ‘시대를 역행하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어느 교수가 말했다고 한다.
서 소장은 “젊은 시절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료를 통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월급을 받으며 주민들에게 감사도 받으니 정말로 좋은 직업이다. 조그만 성의에도 고마워하는 시골의 정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신북면 갈곡진료소에 부임해 영암과의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점차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주기 시작한 때였지만 진료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마을과 진료소 자체의 비용으로 땅을 구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진료소는 자체 회계로 운영됐는데 진료수입과 남은 부분으로 기금 조성을 하며 내실 있게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땅을 구입해 건축비 지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특히 진료소 건물을 짓는데 여러 마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들어서야 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자신의 땅을 대토 형식으로 내줘 정말 기뻤다고 한다. 또 덕진에서 일을 할 때는 용산진료소를 짓는 과정에서 기금을 마련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때도 정말 흐뭇했다고 한다.
서 소장은 갈곡진료소에서 근무할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고 한다. 젊은 시절은 남에게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예의가 바랐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갈곡에 있을 때는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문득 너른 들판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은 얼마나 고단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서 소장은 “할머니들의 흙 묻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이 분들이 아니면 나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이래서 남의 힘듦을 알면 진심이란 것이 통하게 되는 면들이 있었고 고부갈등 등 여러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되니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진료소에선 일반적 질환의 초기증상 치료와 치료 가능성을 판단해 해당 주민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소장의 권고와 처방을 무시하면 더 중증으로 변해 큰 병원으로 가게 된다. 때문에 초기에 질병이 치료되도록 진료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 소장은 “갈곡에선 진심으로 다가서니 신뢰가 생겨 초기 고혈압 증세 등을 가진 마을 주민들에게 약물 투여 없이 운동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점을 들어 운동을 권장했더니 저녁이면 마을 길을 걷는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50~60대에 제대로 된 건강관리는 장수를 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보건진료소도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초기 증상 진료와 처방이 주요 업무였지만 이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 소장은 “오래도록 일을 해보니 이제는 현 시대에 맞는 진료업무 능력에 내가 뒤떨어 짐을 느꼈는데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젊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나는 또 어르신들을 찾아 새롭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시작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올해 공로연수를 받고 진료소장직을 떠나게 된다. 현재 나주 영산포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